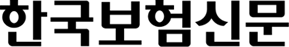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건강상 취약하다는 통념이 국가 단위 데이터로 확인됐다. 동시에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질병관리청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라도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경우 사망 위험이 최대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건강 위험이 ‘혼자 산다’는 사실 자체보다, 생활습관 관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개인 단위의 관리가 어려운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외부 관리 지원 체계가 건강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시사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1인 가구의 전체 및 조기 사망 위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이 25%, 65세 미만 조기 사망 위험은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격차가 불가피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비흡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모두 실천한 1인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은 57%, 조기 사망 위험은 44% 낮아졌다. 특히 이러한 생활습관의 보호 효과는 다인 가구보다 1인 가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혼자 생활할수록 건강 관리 여부가 개인의 위험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만으로도 독거로 인한 건강 취약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또 다른 지점은 1인 가구의 거주 기간이다. 분석 결과 독거 생활이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로의 전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습관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건강 위험이 누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독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기적인 건강 관리와 생활습관 점검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보험업계가 확대해 온 헬스케어 서비스의 방향성을 뒷받침한다. 1인 가구의 건강 위험이 생활습관 관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보험사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단순한 걷기 목표 달성형 건강증진 앱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식단 관리 콘텐츠,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코칭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단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생활 전반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가입자의 경우 건강 관리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헬스케어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에는 1인 가구의 생활 패턴이나 건강 관리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 관리가 잘 이뤄지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