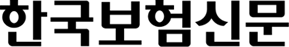장기요양·돌봄·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현행 공급 구조와 제도가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점검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수요 급증’과 ‘유효 공급 제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 이후 중증 돌봄이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인구와 일상생활활동 제약 고령인구가 각각 연평균 3%대 증가한 데 비해, 시설 입소현원은 연평균 8%로 두 배가량 빠르게 늘었다. 입소정원도 연평균 8%대로 확대됐지만, 수요자가 체감하는 유효 공급은 여전히 좁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B등급 시설 비중이 38%에 그친다. 인력 기준위반(24.9%)이나 적정 배설 서비스 미흡(28.5%) 등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선호 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반면, 하위 시설은 정원 미달을 겪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미스매치도 수급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오히려 공급 기반이 취약한데, 2024년 기준 서울의 잔여정원(정원-현원)은 생애말기 고령인구 대비 3.4%로 거의 포화 상태인 반면 전북은 12.4%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설 부족이 중증 노인의 비자발적 타 지역 이주를 초래하고, 가족 돌봄 부담 증가와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져 사회적 손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균형의 배경으로 법률·행정적 제약 속에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일수록 공급자의 편익이 낮아지는 ‘인센티브 불일치’를 지목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일당 정액수가제’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도시권 진입 비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공급이 억제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25년간 생애말기 고령인구가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 재정만으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2034년 40조9000억원으로 늘어 향후 10년(2025~3034년) 연평균 10.2%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수입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수지는 2027년 적자 전환, 누적준비금은 2030년 고갈 전망이 제기된다. 급증하는 수요를 공공이 부지 확보부터 운영까지 떠안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관리·감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혁신은 민간이 맡아 수요 급증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산업적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진입장벽 완화, 인센티브 구조 개편 등 규제 정비와 함께 선제적 공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도 초고령사회와 관련해 지난달 4일 발표한 ‘2026 보험산업과 과제’에서 보험사가 단순한 보장자 역할을 넘어 노후와 관련된 복합적 위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노후 리스크 매니저’로 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업계는 요양·간병 수요 확대 속에서 치매·간병 치료 보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요양시설 개관과 운영 등 시니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첫 프리미엄 요양원을 열었고, KB라이프의 KB골든라이프케어는 신규 시설 개관을 통해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하나생명의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도 수도권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많은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 및 산업확장을 통해 고령화사회에서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까지 확장하고 있다”며 “질병치료를 넘어 돌봄으로 연결하는 리스크 관리자로서 노후 안전망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